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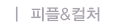
‘95학번’ 김지혜(39) 작가에겐 X세대의 감성이 진하게 풍긴다.
X세대는 90년대 중반의 젊은 세대를 대변했던 명칭. 컴퓨터에 심취한 첫 세대이기도 하고, 중경삼림과 본조비에 열광한 도회적 감수성의 세대기도 하다.기존 관념을 거부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뜻대로 행동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는 비유도 감당한 세대다.
작가 김지혜가 보여주는 사진작업은 X세대의 자유로움과 개성을 대표할만하다.
공식보다는 본능, 치밀한 계산보다는 우연, 관념보다는 오감에 충실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의지대로 도시공간을 재해석한다는 점이 그렇다.
취재 구선영 기자 사진 왕규태 기자
 ▲ City Space S18 Diasec on Pigment Print 90×120cm 2013
▲ City Space S18 Diasec on Pigment Print 90×120cm 2013
 ▲ City Space L05 Diasec on Pigment Print 80×60cm 2012
▲ City Space L05 Diasec on Pigment Print 80×60cm 2012
날것 그대로의 도시가 좋은 세대
돌아보니 여러 가지로 X세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듯싶다(김지혜 작가는 75년생, 95학번, 올해 우리나이로 39세다). 95년 중경삼림이라는 영화에 심취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도회적 감성이 물씬한 점이 여전히 좋았고, 한편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내 작품 역시 무겁지 않다. 예전부터 콜라주 같은 기법으로 감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감각에 의지에 작업하는 편이다. 공기감과 빛, 소리, 촉각 등 오감을 통해 민감하게 공간을 받아들인다. 무르익을 시간조차 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지고 지나가고 겹쳐지고 선택되어지는 도시 공간에서 느껴지는, 날것이 부딪히는 듯한 생경한 느낌을 좋아한다.
 ▲ 홍익대에서 판화를 전공했지만 사진장르까지 넘나들며 자유로운 작업을 펼치고 있는 김지혜 작가
▲ 홍익대에서 판화를 전공했지만 사진장르까지 넘나들며 자유로운 작업을 펼치고 있는 김지혜 작가
장르보다 무엇을 표현하냐가 중요
장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가 전부다. 하나 더, 예술가로서 나의 작업이 작게나마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작가로서 뜻하는 바를 이룬 것이다. 10대 시절부터 지금껏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섞는 작업을 해왔다. 회화, 페인팅을 꾸준히 했고, 대학시절부터는 판화적 개념을 이용해서 사진, 콜라주, 프로타주 등 다양한 기법을 혼용하는 복합예술을 시도해왔다. 특히 선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작업보다는 우리공간이 가진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에 매력을 느끼고 매달렸다. 오늘의 사진작품들은 그간의 긴 여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City Space S15 Diasec on Pigment Print 120×90cm 2013
▲ City Space S15 Diasec on Pigment Print 120×90cm 2013
제어할 수 없어서 역동적인 공간
작업도 삶의 연장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은행 통장 하나를 개설하는 것도 다 ‘선택거리’라는 점을 느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대로 이뤄졌었나? 아니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런 점을 작업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선택거리’가 가장 많이 모인 공간을 찾았고, 그곳이 바로 도시였다. 주로 빼곡하게 건물과 사람이 들어찬 도시가 좋은 대상이 된다. 작품에는 서울 명동이나 영국 런던이 주로 등장한다.
 ▲ City Space S16 Diasec on Pigment Print 225×150cm 2013
▲ City Space S16 Diasec on Pigment Print 225×150cm 2013
디지털이 도시 공간을 바꾼다
도시에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삶 깊숙이 관여하는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에 의한 것들이다.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내 삶에 누가 언제 어떻게 끼어드는지도 모른 채 가치관과 소통방식까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도시 속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컴퓨터로 옮겨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진 원본에서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방향을 살짝 틀은 것일 뿐, 인위적으로 다른 곳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지 않는다. 사진 한 장이 위로 옆으로, 늘어나고 섞이면서, 화려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도시 공간에서 숨어 꿈틀대는 ‘생성과 희망’을 찾아낸듯 쾌감도 느껴진다. 사실 결과물로 나온 작품들은 굉장히 우연적인 게 많다. 나조차도 어떤 이미지로 변할지 모르는 채로 사진을 찍기 때문인데, 작품을 완성해내는 과정이 결코 간단치가 않다.
 ▲ City Space S17 Diasec on Pigment Print 150×100cm 2013
▲ City Space S17 Diasec on Pigment Print 150×100cm 2013
희망주는 공공·환경미술가 되고파
사진 장르가 공공미술 영역으로 들어서길 바라며, 이것을 환경미술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 내가 보는 도시는 결코 삭막하거나 분절된 곳이 아니다.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 희망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곳에 숨은 생성의 힘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